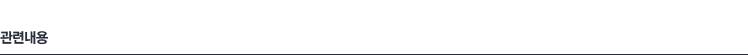|
||
|
에디터 : 김수기 기자
|
어릴 때, 큰 쌀집 자전거를 프레임 사이로 다리를 넣어 탄 추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필자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건 5년 전쯤이다. 어릴 적 기억에 자전거를 탔던 친구들도 없었고, 집 근처에 자전거 가게도 없었던 것 같다. 고향인 부산에서도 그랬지만 서울에 와서도 자전거와의 인연은 없었다. 다행히도 신혼살림 집 옆에 안양천 자전거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것을 보면 주변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
버스로 출근하는 길에 항상 보는 자전거포가 있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가게 중의 하나였다. 자전거를 알기 시작하니 자전거포가 그때서야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몇달 전 자전거포 자리를 세놓는 다는 벽보가 붙더니 결국 한 집 걸러 옆에 있던 쌀가게의 창고로 바뀌었다. 요즘같은 세상에 장사가 될까, 먹기 살기 힘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긴 했지만 막상 없어지고 나니 아쉬움이 들었다.
 |
|
현재 가게 위치로 온 건 4년이 됐고, 예전에는 영등포시장통에서 가게를 했다. |
 |
|
자격증은 없지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용접을 잘했다고 자랑하는 할아버지는 부러진 자전거도 척척 용접해서 고치니 제법 쏠쏠히 돈을 벌었다고 한다. |
 |
|
용접공 출신답게 못쓰는 몽키스패너를 개조해 만든 할아버지만의 공구가 유독 눈에 띈다. |
 |
|
|
 |
|
아마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한 손님들을 위한 것이겠지. |
 |
|
한사람은 튜브를 떼워달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자전거를 도둑맞아서 중고자전거를 알아보려고 왔다. 왠지 내가 사람을 몰고 다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
 |
|
침침한 눈이지만 바퀴 이곳저곳을 보더니... |
 |
|
"허, 이거 참...고물 자전거가 애 먹이네. 자전거값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네." 모르겠다. 자전거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 자전거를 계속 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새로운 자전거를 사는 게 나은지. |
 |
|
|
 |
|
|
 |
|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며 씁쓸한 입맛을 다셨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힘이 있을 때까지 자전거포를 하겠다고 한다. |
 |
|
물이 담긴 대야는 튜브를 교체하는 바람에 쓸 일이 없어져 먼지만 둥둥 떠다닌다. |
 |
|
무시고무(지렁이고무)를 찾는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썼던 캐비넷을 열어본다. |
 |
|
|
 |
|
기름때로 원래 색을 잃어버린 공구함에서 뭔가를 찾는다. 서랍마다 부속품이 가득차 열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공구함도 할아버지의 40년 지기다. |
 |
|
"아저씨, 나 집에 가서 돈 갖고 올테니 좀만 기다려요." "나중에 볼 일 있을 때 주던가..." 동네가게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
 |
|
"아저씨, 이거 얼마요?" "15만원." "너무 남기는 거 아니요? 하하." "나처럼 싸게 파는 사람도 없어." "근데, 난 반도 브레끼가 좋은데, 반도 달린 자전거는 없소." "그럼 이거 타던가?" "아, 그거는 여자 자전거잖소." 결국 자전거포에서도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 |
 |
|
|
 |
|
활기가 넘쳤던 자전거포는 다시 적막해졌다. 할아버지는 또 기약없는 손님을 기다린다. |
자전거포 주인의 나이가 들수록, 고물자전거를 고치지 않고 새자전거를 사는 게 더 이득이 될수록 자전거포는 설자리를 점점 잃어버린다. 그제서야 어떤 위기감이 느껴졌다. 남들은 가지고 있는 자전거포의 추억, 더 늦기 전에 나도 만들어 보자고.
당신은 자전거포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