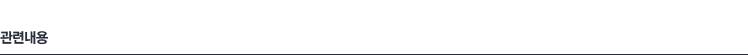|
||
|
에디터 : 장치선 작가
|

Bone shaker Romance
자전거는 볼수록 신기합니다. 당나귀나 낙타처럼 생명을 가진 것도 아닌 것이, 마차나 개썰매처럼 제3의 생명체에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 사람을 태우고 굴러갑니다.
사람이 안장 위에 올라타 고작 하는 거라곤 열심히 두 다리로 노를 젓는 것 밖에 없는데, 그 노동력에 비하면 참 멀리도 갑니다. 참 빨리도 갑니다.
아니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더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얇은 자전거 바퀴 두 개를 놓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니. 균형만 잡는 게 아니라 다리를 움직이기도 하다니, 가끔 한 손을 놓기도 하다니 말입니다.
바퀴 두 개 달린 탈것을 두고 옛 사람들은 '벨로시페드(Velociped)'라고 불렀습니다. '빠른 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벨로시페드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엉뚱한 발명품'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발명품 가운데 엉뚱함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랴만 말입니다.
첫 탄생은 1817년, 카를 폰 드라이스라는 귀족의 호기심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는 바퀴 두 개를 안장으로 연결해 놓고 두 발로 땅을 디뎌가며 달리는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페달 없는 자전거였던 셈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기 짝이 없는, 게다가 불편하기까지 한 탈것이었습니다.
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긴 했지만, '하찮은' 물건 취급을 받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페달은 프랑스 파리의 한 대장장이 부자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피에르 미쇼와 그의 아들 에르네스트 미쇼. 벨로시페드에 페달을 달자 1865년 400대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바퀴가 구를 때마다 그 진동이 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바람에 '본 셰이커(Bone shaker')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뼈를 흔들어 댔다는 얘기입니다.
|
뼈를 흔들어 댔다는 본 셰이커(Bone shaker) |
'본 셰이커' 자전거가 그 이후에 얼마나 더 개선이 됐는지, 얼마나 더 팔려나갔는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바퀴 위에 안장을 얹고, 페달도 단 이 물건이 프랑스 어느 시골마을의 젊은 청춘남녀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프랑스의 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868년에 만들어져서 1929년에 '르 피가로'에 합병된 <르 골르와(Le Gaulois)>라는 잡지를 통해 전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비드 V.헐리히의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두바퀴 탈것>을 통해 이 사랑스런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
르 골르와 |
연애하느라 한창 몸이 달았을 때는 세상에 구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됐든 귀신같이 용케 그걸 찾아내는 법입니다.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드디어 벨로시페드를 찾아냈을 때, 아마 청년은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매일 저녁 땅거미가 질 때쯤, 청년은 사람들 눈을 피해, 부지런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금발 소녀는 연인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깨끗이 닦아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 연애의 절대법칙은 언제가 꼭 들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금발 소녀가 꽤 예뻤던 모양인지, 질투에 눈이 먼 다른 청년 하나가 자기 패거리들을 이끌고 벨로시페드 앞을 막아섰습니다. 물론 청년은 망설임 없이 안장에 올랐고, 사람들의 돌팔매를 뚫고 어둠을 가르며 달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더 이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벨로시페드 청년과 금발 소녀가 행복하게 아주아주 잘 살았더래요.' 이런 빤한 해피엔딩이길 바랄 뿐입니다.
자전거의 역사에도 이런 로맨스 하나쯤 있는 게 뭐 어떻단 말입니까?
사람들 뼈만 흔들었다는(Shake bone) 종류의 사용 후기만 있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나요.
Born To be a 'bone shaker'
삼각형 모양의 자전거, 스트라이다를 보면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듭니다. 조금 감상적이 된다고 해야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트라이다'란 놈은 미니벨로 중에서도 휴대가 간편한 자전거입니다. 외장은 작을수록, 기능은 편리할수록 미덕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영특한 자전거 스트라이다. 이 자전거를 접었다 펴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해야 30초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
바퀴를 분리하고 스티어링핀을 누르는 동작만으로도 신속하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3개의 알루미늄 파이프와 바퀴 2개로 만들어진 심플한 자전거 스트라이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신혼여행으로 대신 한 만화가 메가쇼킹 부부를 헤이리 마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당일 깜찍한 스트라이다를 나란히 타고 와 부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정말 16인치 바퀴에 10kg 정도의 가벼운 무게와 특별하고 심플한 삼각형 디자인으로 '마실용' 자전거 중에서는 단연 최고입니다.
하지만 내 친구는 스트라이다에 몇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은 어리숙하고 부족한 이성이 더 매력적인 법이니까요. 저는 모든 게 완벽한 스트라이다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단 스트라이다는 일반 로드바이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속도가 느립니다. 5.1버전과 달리, 5.0 이하 버전은 변속 기어가 따로 없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조금 더 질기고 강한 장딴지의 파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스트라이다를 타고 장딴지 근육 자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내려서 끌고 가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하지만 인정합니다. 스피드를 즐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자전거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
스트라이다(Strida) |
더 간편하게, 더 슬림하게! 이건 현대의 모든 기기들에게 해당되는 명제입니다. 휴대폰이 그렇고, 디지털 카메라가 그렇고, 노트북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스트라이다에게는 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편하고 슬림하기만 하면 무조건 오케이인 것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인 정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리지널리티라고 해야 할까요.
기계로서의 편리함은 모두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감각과 감성, 휴머니티 같은 것을 우직하게 지켜야 더욱 매력적인 법입니다. 아날로그를 배신하지 않는 디지털? 말을 하면 할수록, 어딘가 부족하고 모순되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야만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엇!
기왕에 아날로그, 디지털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옆길로 새보려 합니다.
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날카로운 신경전을 언제나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요즘 같은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식이 서로 진검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테면, 카메라가 그렇습니다.
필름 카메라, 일명 필카는 희귀해졌지만, 필카 마니아들이 필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디카는 거스를 수 없는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지만, 저는 디카 마니아들에게서 일종의 필름 콤플렉스를 엿봅니다. 언젠가 로모 카메라를 하나 사려고 여기저기 사이트를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모카메라 마니아들 사이에서 꽤 시끌시끌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로모 기능을 탑재한 디카의 등장! 두둥~!
로모사에서 생산하는 카메라는 로모라고 불리는 LCA(Lomo Compact Automat)와 토이 카메라로 불리는 액션심플러를 비롯한 플라스틱 카메라가 있습니다. 물론 로모 마니아들이 로모 카메라로 부르는 것은 플라스틱 토이 카메라가 아닌 LCA 카메라입니다. 필름 카메라의 한 종류이지만, 로모는 피사체를 정직하게 담아내는 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진 외곽도 뿌옇고 어두운 것이 일단 몽환적인 기분에 취하게 합니다. 진정 감성의 카메라입니다.
디카의 로모 기능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사진 귀퉁이가 본래 보다 어둡게 나옵니다. 비네팅(Vinetting) 효과라고 부릅니다. 언뜻 보기에 로모로 촬영했나 싶은 느낌을 주지만, 도도하고 고집 센 로모 마니아들은 이걸 '짝퉁'으로 봅니다.
로모의 감성은 기계적인 효과로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들면, '로모 자체가 기계가 아니더냐'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극단적인 물음은 카메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대답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로모 마니아들의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이 고집을 사랑합니다. 도도할수록 매력적인 법이니까요.
비슷한 일이 자전거에서도 있습니다. 일명 '스트라이다 논쟁'입니다. 1987년 영국의 마크 샌더스에 의해 디자인된 이 스트라이다가 20세가 넘어가면서 특허가 만료됐습니다. 이제는 일반명사처럼 입에 붙어버린 스트라이다를 스트라이다사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로서는 삼각형 프레임의 자전거를 구입하느라 50만 원이 넘는 돈을 꼭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나만의 스트라이다가 아니라 모두의 스트라이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제작한 cf폴딩, ezst(이지스트)부터 우리나라의 삼천리자전거가 내놓은 이지바이크…. 이것들이 모두 스트라이다라는 명함을 내놓으며 세상 여기저기를 굴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가격이 겸손해졌습니다.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스트라이다 마니아들도 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스트라이다가 그저 그렇고 그런 기계에 불과하단 말인가. 스트라이다를 스트라이다이게끔 하는 것이 고작 삼각형 모양의 프레임뿐이란 말인가. 저 스트라이다의 삼각형 프레임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뼛속까지 뒤흔드는 그 울림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인가! 진짜 본 셰이커 스트라이다'라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