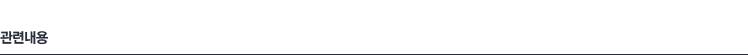|
||
|
에디터 : 이호선
|
잠비아(Zambia)
 |
|
치룬두(Chirundu)까지 60km에 상당하는 동물의 왕국이 시작된다. |
결국 오후 4시경, 나는 국경도시, 치룬두(Chirundu)에 도착하며 국경을 넘는다. 짐바브웨와 잠비아 사이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고 긴 철제다리가 유일한 통로이다. 이 철제다리를 건너자 출입국사무소가 있는데 묘하게도 한 건물, 한 사무실에서 두 나라의 출입국 관리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앞 줄의 책상에는 짐바브웨의 관리들이, 그리고 뒷줄에는 잠비아의 관리들이다. 50불의 비자 Fee를 내자 스탬프를 찍어준다.
 |
|
양국을 잇는 유일한 통로인 철제 다리. |
출입국 관리사무실의 입구에서부터 2명의 청년이 달라붙어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외국인인 나를 안내하고 돕는다는 것이 그들의 명분이지만 나에게 그 어떤 도움도 안되고 거추장스럽기만 하다.
분명 인간똥파리들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호주의 파리들처럼 도무지 떨어질 생각을 안 한다. 출입국 관리사무실 안에서도 내 옆에 꼭 붙어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 허가 받은 인간똥파리들이다.
은행이 어디냐는 나의 질문에 그들은 막무가내로 나의 앞장을 서고, 싼 여관을 찾는다는 나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호의를 원치 않는다!"는 나의 의사도 무시한 채, 그들은 막무가내로 나의 앞장을 선다.
결코 싸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20불의 게스트하우스에 나를 안내한 그들은 드디어 나에게 그들의 진심을 드러낸다. 어디서 집어왔는지 세관통과확인서 한 장을 나에게 보이며, "모든 여행자들은 까다로운 짐 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너는 무(無)검사로 통과하는 대신 그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라"는 것이 그들의 숨겨진 진심이었다.
이제껏 수많은 나라들의 국경을 넘으면서 이런 파렴치한 작태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아주 멀쩡하게 생긴 젊은이들로 상당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다. 결국 두 인간똥파리들은 나에게서 15불을 받고서야 떨어져 나갔다.
20불이나 지불한 방이지만 화장실은 20m 떨어진 공중화장실이고 찬물만 나오는 샤워실 수도꼭지는 말라붙은 지 오래다. 화장실 옆의 어두컴컴한 구석에 있는 땅속에 박혀있는 수도꼭지의 물로 그대로 야외샤워를 한다. 2~3일 전부터 감기몸살증세로 전신이 쑤시지만 무시할 수밖에 없다.
방으로 돌아 와 '동물의 왕국'을 넘다가 연 이어 구멍 뚫려버린 두 개의 튜브를 가물가물 시원치 않은 실내등 아래서 때우고 나니 밤은 이미 상당히 깊어져 있다. 온 몸의 긴장이 일순에 풀어지며 나는 침대 위에 무너진다.
꽤나 길게 느껴지는 하루가 이제 겨우 끝난 것 같아!
 |
|
20불이나 지불한 변변치 않은 여관방의 시원치 않은 불빛 아래서 나는 구멍 난 두 개의 튜브를 때운다. |
 |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Lusaka)까지 140km정도인데, 초반전부터 튀어나오는 만만치 않은 길이 힘겹다. 급격한 경사는 결코 아니지만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는 오르막의 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대지를 태울 듯이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아래 잠시라도 몸을 숨길 곳은 도로변 어디에도 없다.
그래도 잠비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도로변에 토마토나 수박 등을 내다 팔고 있는 작은 노점상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 나는 즐겁다. 100km나 계속되었던 오르막의 길이 겨우 끝이 나고 카프에(Kafue)시(市)가 코앞에 있다. 헌데 카프에 시를 5km정도 남기고 시작된 도로의 갓길이 나를 괴롭게 한다.
분명 포장된 갓길인데 도로의 표면과는 딴판으로 울퉁불퉁 춤을 춘다. 단단하면서 불규칙해 짐을 싣고 있는 내 자전거는 상당한 충격으로 출렁거리며 달려야 하기에 바퀴살이 언제 부러져나갈지 눈앞이 캄캄하다.
오후 5시가 넘은 시각이라 도로에는 이미 차량들이 줄을 잇지만 위험과 경적의 횡포를 무시하며 도로와 갓길의 경계선 위로 곡예주행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카프에 시에 도착한 후, 주행을 멈추고 싼 여관을 찾는다.
 |
|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도 이것은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
 |
|
도로변에 있는 구멍가게. 옆에는 토마토 가판대가 있어 태양 속을 허걱거리며 달리 온 나는 토마토로 목을 축이고 또 영양을 챙긴다. 젊은 사장인 케오빈(Keovin)은 넉넉한 마음으로 지쳐있는 나를 위로한다. |
 |
|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는 미모의 두 여인, 클라라(Clara)와 아이다(Eida). 나는 오랜만에 만나는 수박을 결코 무시 간과할 수 없어 작은 것을 한 통(1,500원 상당) 사서 앉은 자리에서 해치운다. 토마토나 수박의 맛은 형편없지만 토마토와 수박이 있다는 사실하나 만으로도 감사를 해야 한다. |
 |
|
|
9불을 지불하고 들어 온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음산한 여관이지만 조용한 것 하나는 내 맘에 든다. 공중화장실과 샤워장에는 수도꼭지가 달려 있을 뿐으로 정작 물은 나오지 않는다.
뜰에 쓰러질 듯 서 있는 수도꼭지를 열어보니 물이 흐른다. 오늘도 역시 야외샤워를 해야 할 판이다. 숨막히게 뜨거웠던 하루도 저녁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며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다. 마침 차가운 바람마저 텅 빈 뜰을 요란하게 휘젓고 있다.
잠시 동안의 주저함을 걷어차 버리고 나는 여관방 앞에 있는 시멘트 바닥의 공터에서 한 시간 동안의 운동을 끝낸 뒤, 찬물의 야외샤워를 감행한다. 불평 불만을 하기보다는 그나마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감사해야지.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않은가?!
세상살이가 내 맘 같지 않다고 해서 불평 불만하고 병만 빨아댄다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욕이 절로 나오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만큼은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져야 해. 내 맘 같지않은 이 세상을 빙자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내 삶의 순간들을 유기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것 봐! 비록 머리가 아프고 전신이 쑤시지만 운동을 하고 물을 뒤집어 쓰고 나니 또 다시 삶의 환희로 내 가슴이 벅차 오르잖아!! 민 태원 님의 '청춘예찬'을 소리 높여 읊고 싶을 정도야!"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巨船)의 기관같이 힘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꼭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싸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
잠을 자려고 하니 숲 속에서도 경험하지 않은 모기들이 나를 들볶기 시작한다. 엉성한 창문의 틈 사이로 날아들어 온 모기스키들이다. 비록 나는 소형 모기장을 가지고 있으나 모기장을 친다 해도 나의 신경을 지치게 할 적지 않은 모기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듣기 싫어 창문과 방문을 활짝 열어 놓은 후, 옷을 껴입고 침대 위에 펼친 침낭 속에 들어가 자기로 한다 결국 모기들은 차가운 공기에 날개조차 펼치지 못한 채 그들의 야간비행을 포기하고 만다.
내가 있는 뒤채 여관방들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어 고요하기 짝이 없음에, 나는 결국 이 고요함의 달콤한 유혹을 떨치지 못한 채 하루를 더 뭉그적대기로 결심하고 여관방안에서 길고 긴 오수를 즐긴다.
정말 오랜만에 달콤한 '오수(午睡)의 추억'을 되 새긴다.
카프에 시(市)를 지나 루사카(Lusaka)를 향해 달리던 중, 이제껏 결코 만나지 못했던, 제대로 격식 갖춘 동네 바이커(Local Biker)의 출현에 나도 모르게 '억!'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급정거한다. 도로의 반대편에서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달려오고 있던 그 또한 내 앞에서 급히 페달 질을 멈추며 나와 똑같이 놀람과 의아함으로 나를 바라본다.
"학교에 가는 길이냐?!"
"…………………………"
금방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올해 12세인 카오스(Chaos)군- 앞에서 나는 후회한다.
'내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 것임에 틀림이 없어!'
"학교에 가고 싶지만 나는 일을 해야 해요! 나는 지금 카프에 시(市)에 있는 일터로 달려가고 있는 중 이예요."
비록 짧은 영어로 자주 끊기지만 또박또박 대답을 한다.
그래 그래, 나 또한 초등학교 때 월사금을 번번히 제때에 못내 6년 내내, 방과 후의 교실청소를 운명처럼 해야 했고 어머니는 뻑하면 담임선생님 앞에 소환되었지.
교실청소를 하던 중, 소환되어 교단 밑에서 그녀의 두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결코 모르고 선 채, 교단 위에 서 있는 담임선생님과 숨가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비록 어린 나이었지만 가슴이 무척 아팠단다. 지금의 너처럼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엄두조차 못 냈지만 결국 어머니의 불굴의 의지와 집념으로 대학교까지 갈 수 있었어. 나는 분명 행운아지!
카오스(Chaos)군은 심기일전(心機一轉)하며 멍하니 서 있는 나를 향해 바야흐로 힘차게 떠오르고 있는 태양같은 찬란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더니 덜그럭대고 삐걱거리는 그의 자랑스런 자전거의 페달에 힘을 주며 카프에 시를 향해 씩씩하게 달려 간다.
"아자, 카오스 군!"
동네 바이커인 카오스 군을 지나친 뒤 얼마 되지 않아, 이 번엔 국제 바이커 한 명이 선명한 이태리의 깃발을 펄럭이며 나를 향해 힘차게 달려 와 멈추어 선다. 상당한 무게의 짐을 보유한 그, 앙드레아(Andrea)는 이태리의 베네치아에서 페리를 타고 3일 걸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후, 아프리카종단을 시작해서 이미 5달이 지났다고 한다.
그의 자전거 핸들에 붙어있는 거리측정기에는 8,000을 훨씬 넘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있다. 이제껏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부모와 함께 살며 무료한 삶의 공전(空轉)을 거듭하던 중, 난생처음으로 감행한 야심 찬 도전이 이번 아프리카 자전거 대장정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그는 이미 상당히 격앙(激昻)돼 있었으며 말을 잇고 있는 동안 그의 전신을 타고 흐르는, 과부하(過負荷)의 에네르기가 나의 손끝과 발끝까지 전해져 스파크가 튈 정도다. 그의 용기와 불타는 도전의지는 결코 적지 않은 그의 연륜(年輪)을 무색하게 만든다.
"브라보, 브라보! 그대는 진정 챔피언이요! 꿈과 도전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언제 어디서라도 결사(決死)감행해야 할 삶의 최고가치인 것이요!"
우리의 삶의 사전(辭典)에는 분명 승자와 패자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소. 하지만 승자와 패자의 의미는 각자 자신의 삶 속에 확실하게 존재하며 우리를 들볶고 있지. 내가 지금 심각하게 꿈꾸고 있는 것을 끝내 도전하지 못할 때 나는 분명 내 삶의 패배자요, 내가 기어코 도전을 감행한다면 나는 분명 내 삶의 승자, 챔피언이 되는 것이요. 어차피 우리 삶의 심판관은 우리들 자신 아니겠소?!
We're the champions / by Queens
우리는 챔피언이야, 나의 친구들아
우리는 끝까지 싸워 나갈 거야.
우리는 챔피언이야. 우리는 챔피언이야.
패배자들을 위한 시간은 없어.
우리가 이 세상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카프에(Kafue)에서 40여km에 불과한 루사카(Lusaka)에 다가 갈수록 도로는 더욱 나빠지고 불어대는 바람에 자욱한 흙먼지가 도시상공을 소용돌이치고 사방으로 흩어지며 뭐가 뭔지 온통 뒤죽박죽이다.
오전 11시 반경, 시내에 들어 와 슈퍼마켓에 들러 비상식품을 사서 자전거에 비축하고 뭔가 그냥 떠나기가 아쉬워 어기적대다가 내 주위로 모여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혹시 한국인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으니 흔쾌히 식당의 위치를 종이에 그려주어 시내 구경 삼아 돌고 돌아 찾아 냈는데, 실상은 한국식당의 간판을 내건 중국인이 하는 중국인식당이다.
한 마디로 '짝퉁 한국식당'! 중국인 사장에게 진짜 한국식당의 소재를 물으니, 카블롱가 거리(Kabulonga St)에 있다고 한다. 카브롱가 거리를 따라 달리다 보니 도로변에 한국식당의 선전벽보가 눈에 확 들어온다. 역시 '대장금'이다. 벽보에 그려진 약도를 따라 달려가 보니 짝퉁이 아닌 진짜 한국식당이 나의 입을 찢어지게 한다. 비록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한국식당을 찾아 왔지만 한국음식을 꼭 먹고 싶어 온 것이라기보다는 만나기만 해도 이미 배가 부르는 한국사람이 그리워 찾아 온 것이다.
상당히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식당 안으로 들어와 보니 두 한국인 여성이 식사를 하고 있다.
듬직한 체구에 조금은 무뚝뚝해 보이는 전형적인 한국인 아저씨인 사장님, 김 태윤씨와 사모님, 송 숙자씨가 나를 반긴다. 사장님은 이 곳 거주 7년 째로 사업차 이 곳에 왔다가 최근에 이 식당을 개업했다고 한다. 루사카에는 단지 2개의 한국식당이 있고 그 중 하나가 이 '대장금'이다.
잠비아에 있는 한국교민의 수는 단지 60여명에 불과한데 역시 여느 다른 아프리카의 나라들처럼 한국교민들의 대부분은 선교사업과 관련된 분들이라고 한다.
 |
|
|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식당의 점심시간이 끝난 1시 반경, 이 분들의 점심시간이 시작되었고 나도 이 분들 틈에 끼어 점심을 먹는다. 구수한 된장찌개와 김치에 상추를 먹고 있는 동안 심장의 박동수가 올라간다. 나는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감동을 먹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축복이고 감사다!
식당을 나온 시간이 3시경이라 페달 질을 서두른다. 어두워지기 전에 시내를 완전히 빠져나가 시내에서 완전히 잊혀진 숲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저녁 6시경, 나는 무사히 무성한 억새풀밭너머 숲 속으로 돌아 와 나의 둥지를 튼다. 초생 달이 유난히 밝다. 달 밝은 밤의 운치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으나 달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나의 어둠 속 야영이 쉽지 않아져 나에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
|
|
여행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