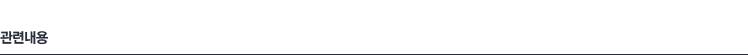|
||
|
에디터 : 이호선
|
호프(Hope)에서 프린스톤(Princeton)까지 고개길이 종종 나타나며 나를 숨가쁘게 만들곤 한다. 해발고도가 1282m, 1300m의 두 고개를 넘으니 프린스톤을 12km 남기고 내리막길이 시작 되려는 지점에 내리막 길 전에 항상 보이듯 "Check brakes!"라는 노란 경고 판이 예사롭지 않다. 도로의 오른 쪽 편에선 너 댓 명의 트럭 운전사들은 그들의 트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역시 길게 이어지는 내리막길은 나에게 시속 60km의 질주쾌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었다.
케레모스(Keremos)를 지나자 마치 낙동강을 연상시키는, 굽이굽이 완만히 강이 흐르고 도로 또한 평지가 계속된다. 강변을 따라 수많은 캠핑 족들이 평화스런 주말을 즐기고 있다.
나도 오랜만에 강변에 텐트를 치기로 한다. 눈이 녹은 물이라 물이 차지만 몇 번에 걸친 숨죽임으로 목욕을 하고 빨래도 해 치운다. 작은 모래 밭 위에서 텐트를 치고 자지만 고비의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다. 고비사막 모래바람의 웅웅거림이 아닌 신선하고 싱그러운 강물의 재잘거림과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상쾌하다. '모래'라는 제목은 똑 같은데 책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전개된다.
빗방울이 천막 위를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깬다. 문득 어제 만났던 스테판의 얼굴이 빗방울에 겹친다. 그는 지금 어디서 이 비를 피하고 있을까? 천막 안에 앉아 깜빡 깜빡 졸다 깨다를 몇 번인가 하는 동안 비는 우리를 더 이상 가슴 아프게 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갔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수많은 캠핑 카 들이 줄을 잇는다. 캐나다인들은 그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공언을 하듯 철저한 '야외족(Outdoor people)'이다. 캠핑은 여가 중 아주 건전하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연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캐나다 인들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순수한지 모르겠다. 하지만 미국과 짜고 노는 것처럼 '바비큐와 맥주'로 일관하는 그들의 문화에는 별 새로움이 없어 보인다.
가끔씩 도로변에 나타나는 폐허처럼 썰렁한 마을, 인디언 보호구역. 그들은 보호구역 안에서 죽는 그날까지 굶어 죽을 걱정 없이 살수 있지만 보호구역을 벗어나면 보조금은 사라진다고 한다. 그들에게 꿈꾸고 도전하고 성취해야 할 '삶의 목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살아 있을 뿐이다.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나는 안 본 듯 안 지나간 듯 조용히 지나갈 뿐이다.
|
가끔식 나타나는 인디언 보호구역 |
|
하이웨이는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진다. 마치 내가 오래 전에 뗏목여행을 했던 굽이굽이의 낙동강을 따라 달리고 있는 듯. |
프린스톤에서 케레모스까지 68km의 구간은 강을 따라 구비구비 비교적 완만한 길로 그림같은 농촌이다. 많은 유기농작물과 라즈베리(Rapsberry), 블루베리(Blueberry)의 농장들이 이어진다. 길가에는 농작물을 직매하는 가판대가 줄을 잇는다.
이어지는 오소유스(Osoyoos) 또한 포도와 과수농장들이 이어졌는데 과수원의 나무 밑에는 많은 텐트가 쳐져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남미의 계절노동자들이 있다. 슈퍼에서도 상점에서도 남미계의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곧 시작되는 언덕길이 최소한의 숨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고 어둠 또한 순식간에 나의 주위를 집어 삼켰다. 어둠 속에 쑤시고 들어간 곳이 개인 사유지의 넓은 정원의 끝 자락 인 듯. 결코 멀지 않은 곳에서 듣기만 해도 으스스한 어떤 큰 개의 짖는 소리가 나의 온 몸을 긴장시키지만 그의 경고사격의 목표는 내가 아닌 듯해서 나는 숨 죽이고 은밀하게 하룻밤 집을 짓는다.
오늘도 계속되는 언덕길의 행진. 집도 거의 없고 산길을 끝없이 올라갈 뿐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까지 5시간 이상을 걷고 나자 비로소 굽이굽이 완만한 시골길이 다시 나타나며 나를 안심시킨다.
|
"어이, '엘파마'군, 제내 들 내려다 보고 있는 소감이 어때?!" |
평화스럽고 고요한 시골길을 달린다. 하지만 괴물 같은 자동차가 자주 고요한 평화를 산산조각으로 내버린다. 이곳의 차량은 모두 탱크 같은 엔진을 가진 대형 픽업트럭이 많아 아주 요란스럽다.
도로를 달리는 동안 주유소와 식당은 나의 말고픔과 배고픔, 그리고 물고픔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곳이다. 나와 짐을 주렁주렁 짊어진 '엘파마'군 앞에 언제나 호기심을 가진 많은 이들이 다가와 말을 걸고 얘기는 순조롭게 이어지지만 결국 꼭 나오는 말은,
"체력이 필수인 이 힘든 여행을 하면서 왜 담배를 피우느냐?!"
"정말 그래. 나는 담배를 끊은 지가 이미 10년이 훨씬 넘었어. 그런데 이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또 담배를 피우고 있지. 2년 전에 북반구 세계 한 바퀴를 돌고 있을 때 나는 담배를 다시 피웠고 한국에 돌아온 후 한국에 있는 동안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 이 번에 세계여행을 시작한 후 나는 또 다시 이 지경이 되었어.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야. 정말 긴 시간을 홀로 여행을 해야 하는 대륙 횡단 바이커들 만의 끔찍한 고독과 심심함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집이나 사무실에서는 아무 때나 차를 마시고 심심풀이 오징어를 씹을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수많은 나라의 국경을 넘고 텅 빈 사막을, 100km이상을 달려도 아무 것도 없는 숲 속을 홀로 달리다 보면 가장 간편한 게 담배뿐이지. 피고 나면 오직 나의 숨만 가빠짐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오늘 저녁 맛있는 커피를 마셔야지'가 그날의 희망이 될 수 있듯, '담배 한 가치를 맛있게 피어야지'가 희망이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처절한 희망이야. 나는 반드시 이 처절한 희망에의 유혹을 단호하게 차 버려야만 하는데,……
|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침메뉴는 변함이 없다. 계란 후라이, 토스트, 그리고 감자튀김 |
공매이든 이유 있는 매이건 매 앞에 장사는 없어. 많은 이들이 매에 의해 패인이 되어가는 가운데, 어이없게도 장사는 부단한 매의 단련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고독 앞에 강자가 없지만 강자는 고독의 단련에서 태어난다.
그랜드포크(Grand Forks)를 지나 유채꽃이 만발한 언덕 위로 기어오른다. 의외로 모기가 없어 평화스런 밤을 보낸다. 하늘엔 만발한 유채꽃만큼이나 별들이 총총하다.
또 다른 파란하늘과 뜨거운 태양의 하루가 시작된다. 케슬가(Castlegar)까지 3시간 반정도 끝없이 가파른 직벽의 길이 나와 엘파마의 숨통을 조인다. 결국 우리는 1585m정상에서 비로소 긴 한 숨을 몰아 쉰다.
|
숲 속의 검은 흡혈귀인 모기를 피하기 위해 개울가의 모래밭은 꽤나 괜찮은 곳이다. |
캐나다에서의 식수는 아무 걱정 없이 해결되고 있다. 주유소건 화장실물이든 마셔도 물맛이 아주 좋다.(비록 'Non drinkable'이라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지만)물맛이 좋다는 것은 뱃속에도 좋은 것 같다. 이제껏 아무 탈이 없으니 말이다.
문제는 숲이다. 언제나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숲이지만 숲의 그늘 속엔 지나가는 가엾은 방랑자를 노리고 있는 아주 흉측한 놈들이 우글거린다는 또 다른 냉엄한 진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뻔뻔스런 놈들이 바로 모기이다. 수 십km까지 나를 쫓으며 나의 온 신경을 유린하는 것은 파리들이지만 그것들은 이미 수명을 다한 지구상의 모든 유,무기체를 완벽하게 분해시켜 또 태어날 새로운 생명체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역할을 해내기도 한다.
하지만 모기들은 그저 모든 생명체의 원천인 피를 무차별로 무상으로 빨아 먹을 뿐이다.
모기는 숲의 선물인가, 아니면 숲의 재앙인가?! 나의 머리부터 온 전신은 울퉁불퉁으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도 없이 깨어 한바탕 긁어 대야 한다. 매일 나는 3시간 전후의 잠을 자며 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배고픔을 더욱 느끼고 있다.
고비사막의 백과사전에서는 끈질긴 쇠파리는 있었으나 모기는 없었다. 웬만하면 숲 속이 아니고 바람이 있는 언덕 위나 물이 흘러가는 개울이나 강 주변의 모래 밭 위가 그래도 모기가 적다. 나는 매일 밤 모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결국 도로변 위에 종종 나타나는 절벽 위에 텐트를 치는 것이 쉽고 이상적임을 알게 된다.
물론 자전거와 짐은 그대로 숲 속의 나무에 묶어 놓고 텐트와 침낭만 가지고 절벽위로 기어 오른다.
여행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