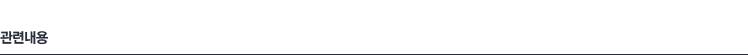|
||
|
에디터 : 이호선
|
|
캐나다 밴쿠버의 민박집 앞에서 |
|
밴쿠버 시내. 나는 그저 It's almost paradise!를 외칠 뿐이다. |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밴쿠버는 지난 3주간 내가 통과했던 중국과 고비사막과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날씨와 풍경을 보여주는데 나는 그저 "It’s almost paradise!(여긴 거의 천국이군!)"를 연발할 뿐이다. 푸른 숲과 파란 하늘, 맑은 공기, 그리고 잔잔한 바람. 이것 뿐만 아니다. 거리는 완벽하게 깨끗하고 조용하며, 도로는 원칙과 배려라는 상식에 완벽하게 지배되어 어떤 억지나 막무가내도 없이 순조롭게 흐른다.
도시의 하늘을 관통하며 달리는 스카이 트레인(Sky train)을 타면 개찰구도 개표원도 없다. 그저 종이조각인 표를 양심적으로 살 뿐이다. 모든 일이 강제가 전혀 없는 자율에 의해 움직인다. 이것은 분명 모든 인간들이 염원하고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오래 전에 일본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양심, 자율, 배려로서 완벽한 시민의식의 전형이다. 이 정도(A++) 등급이면 내 몸에 치가 떨릴 정도인데,………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들도 모두 팬시 카들 뿐이고 넘쳐흐르는 슈퍼의 생필품들만큼이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으로 흠뻑 젖어있는 곳이다.
'허, 저 친구는 코르벳을 타고 와서 맥주를 사가네!'
'몽골의 고비에서는 말을 타고 가게로 내려와 몽골의 보드카를 사 가지고 가는데,……….'
풍요의 거리, 풍요의 도시를 가로 질러 걷고 있지만 내가 정작 느끼고 있는 것은 텅 빔, 공허 뿐이니 어쩐 일인가?! 아이러니같이, 텅 빈 고비에서 나는 무엇인가 나의 온몸에 꽉 차 오름을 느꼈다. 완벽하게 비어진 고비의 모래 위를 하루 백리씩 2주간 걸으면서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나 자신과 솔직 담백한 대화를 나눴다.
'없다, 완벽하게 없다. 비었다, 철저하게 비었다. 그저 바람소리만이 유일하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내 가슴 속 가득 차 오르는 것, 그것은 바로 평화와 자유! 여태껏 자신의 거울 위에 붙여졌던 프리즘과 불투명, 화려한 셀룰로이드 종이를 인정 사정없이 걷어내고 솔직 담백한 거울 하나 만으로 자신을 비춰 보면서 나 자신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바로 이 곳이 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갈구하며 찾아 헤매는 최후의 목적지가 아닐까?!'
나의 일정이 뒤집히면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다. 물가 비싼 북미대륙에서 미적거려봐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란 '가산탕진' 밖에 없지만 나는 구 여권을 새로운 전자여권으로 바꾸기로 하고 3주가 걸리는 절차를 마쳤다. 나는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서 제일 크고, 남한의 1/3의 면적을 갖는 섬 밴쿠버 아일랜드(Vancouver Island)를 한 바퀴돌기로 하고 민박집을 나온다.
|
스탠리 파크의 입구 |
|
체코에서 온 대륙횡단 바이커 데이빗 |
캐나다의 우기는 겨울이고, 여름에는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처럼 상쾌하고 맑은 날이 많다고 한다.
자주 흐리기도 하지만 비는 잘 안 내리는 듯해서 다행이다.
민박집이 있는 버나비(Burnaby)를 나와 다운타운을 가로 지르며 뉴욕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를 연상시키는 스탠리 파크(Stanley Park)를 지나면 페리가 있는 홀수슈 베이 포트(Horseshoe Bay Port)가 나온다.
햇볕이 쑤시고 들어 올 여지가 없이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이어지는 스탠리파크를 관통하는 도로를 따라 힘겹게 오르고 있는데, 내 앞으로 마치 나의 자화상을 보는 듯, 짐이 주렁주렁 매달린 자전거를 타고 페달 질을 계속하고 있는 사나이가 있다. 마주 보고 통성명을 하지 않아도 그 친구의 이력이 확연하다. 이름이 데이빗(David)이고 체코(Czek)출신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뿐 아니고, 체코와 체코의 국기까지 그가 입고 있는 재킷의 등에 칼라로 그려 넣었다. 그는 나와 마주하자마자 담배를 권하는데 나도 아주 익숙한 중국담배다. 그는 그의 나라, 체코에서 시작해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횡단한 후 블라디보스톡에서 중국 경유 한국까지 여행한 후, 비행기로 밴쿠버에 도착해서 캐나다를 횡단한 후 몬트리올에서 비행기로 체코로 돌아간다고 한다. 내가 2년 전 캐나다를 횡단한 구간을 정확하게 역순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미 10,000km를 달렸다. 그 역시 특별한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힘겹게 3개월의 러시아비자를 받아 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의 동해안을 달렸는데 너무도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한국의 음식이 쥑인다며 두 눈을 뱅글뱅글 돌리며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을 때, 나는 그저 '꼴깍 꼴깍' 마른 침을 하염없이 넘기고 있을 뿐이다.
'자슥, 왜 난데없이 한국음식 얘길 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무국적 위(胃)를 가졌다고는 하나, 생각만해도 침이 흐르고 위가 발광하는 것은 역시 한국 음식이 아니겠어!!'
그는 첫 눈에도 아주 단단한 몸매의 소유자다.
"혹시 너 축구 했냐?!"
"맞아, 맞아." 갑자기 그의 어깨에 힘이 제대로 들어간다. 다리의 근육이 예사롭지 않다.
그는 '나를 따르라!'는 제스처와 함께 앞장 서서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한다. 도로의 경사가 시시각각으로 급해진다. 이미 70-80m정도 앞서가고 있는 그를 쫓기위해 나는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안간힘을 다 쓴다.
"명색이 세계 일주를 했다는 내가 여기서 주저 앉으면 쪽 팔리는 일이지!"
'엘파마'까지 나를 다그친다.
"나까지 쪽 팔리지 않게 확실하게 페달 질 하라구요!"
순식간에 땀이 강이 되어 흘러 내린다. 드디어 길고 긴 언덕길의 정점에 도달한 듯, 그 친구가 자전거를 가드레일에 기대어 놓고 여유만만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나를 지긋이 내려다 보고 있다. 나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감쪽같이 길고 긴 한 숨을 내 쉬며 그에게 다가간다.
"너 몇 살이냐?"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의 가벼운 잽을 허용하고 잠시 주춤했다.
"나, 오십하고 말이야 하나야!"
"…………………"
뭐야, 자신만만하게 나에게 다짜고짜 잽을 날렸던 그가 순식간에 글러브를 벋고 링에서 내려간다.
"나는 29살인데,……………"
그는 나를 향해 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가벼운 목례까지 하며 나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자신의 수첩에서 빈 페이지를 찢어 내어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적어주며 유럽을 지날 때 꼭 자신에게 연락하란다.
'어쨌거나 나는 너를 쫓느라고 무릎관절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
|
호스슈 베이에서 디파쳐 베이로 가는 선상에서 |
|
밴쿠버 아일랜드 |
나는 페리 포트(Port)로, 그는 로키 산맥을 넘기 위해 99번 하이웨이를 타기 위한 갈림길에서 나는 아침에 내가 삶은 계란 7개중 3개를 그에게 주었다. 그는 모든 이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좋아했다. 그와 정확히 27km를 함께 달렸다.
오후 3시를 조금 지나 출항한 배는 5시가 되어 도착한다. 캐나다에는 대서양, 태평양에 면해 있을 뿐 아니라 내륙에도 크고 작은 호수와 강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페리가 운항되고 있는데 승용차, 버스, 트럭까지 그대로 승선을 하기 때문에 배의 덩치들이 모두 크다.
주위에 보이는 수많은 산들의 산정에는 눈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인지 바람이 아주 차다.
해안을 따라 북서로 뻗어있는 #19하이웨이를 타고 나는 달린다. 본토의 캐나다와 너무도 똑같이 높은 산과 빽빽한 숲 일색으로 띄엄띄엄 집이 있을 뿐으로 인적도 없이 그저 이따금 지나가는 차들만이 숲 속의 정적에 파문을 일으킨다.
시계바늘이 이미 저녁 10시 근처에까지 와 있으나 주위가 확실히 식별될 만큼 결코 어둡지 않다. 하늘이 심상치 않지만 한 번 하늘을 믿어보기로 하고 도로 변 숲 속에 텐트를 펼친다. 11시 반경, 하늘은 나의 믿음을 완전히 져 버리고 내 머리위로 물을 뿌리기 시작한다. 만일을 대비해 텐트 위에 자전거 포장용 비닐을 쳐 놓았지만 자전거의 모서리에 찢겨져 빗물이 시시각각 텐트위로 떨어지며 외로운 여행자의 마음과 몸을 슬픔의 강 속에 밀어 넣는다. 그저 앉아 질겅질겅 식빵을 씹으며 하염없이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다. 자비롭게도, 하늘은 나를 절망에 빠뜨리기 전에 순순히 수도꼭지를 잠갔다.
|
폭우를 피하기 위해 자전거 포장용 비닐을 쳐 놓았지만... |
새벽 4시면 주위의 모든 것이 나의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몇 겹의 두터운 층을 이루며 세상을 무겁게 찍어 누르고 있던 구름이 시시각각 밀고 올라오는 태양의 기세에 밀려 고비사막의 모래처럼 산산이 부서지며 뿔뿔이 흩어진다.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에게는 역시 태양뿐이다, 설령 그 태양에 숨 막히고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본토 캐나다의 그것과 한 치의 다름이 없는 이곳의 자연을 달리는 동안, 엘크와 블랙 베어들까지 나의 앞에 등장하며 그 한결 같음을 증명한다. 어쩌면 단조롭고 한결 같은 이 숲 속을 따라 달리면서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이란 한 참 만에 도로변에 나타나는 주유소의 카페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 동안 묵묵히 참고 견딘 '말고픔'과 '배고픔'을 일순에 박살내며 소통(疏通)의 위대함을 체험하고 노래하는 것이다.
무언(無言)의 소통은 항상 우리에게 심장파열의 감동을 주지만 유언(有言)의 소통은 우리에게 왕성한 식욕과 함께 우리를 노래하고 춤추게 한다. 이는 분명 엄청난 감동인 것이다.
|
내가 캐나다에서 종종 이용하는 식당 서브웨이. 온갖 야채가 들어간 샌드위치는 나에게 최고의 음식이었다. |
|
나의 종아리에 반했다며 나에게 청혼한(농담이지만)주유소의 매니저, Carmen. 그녀는 나에게 빅 사이즈 커피를 무료 제공했다. |
여행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