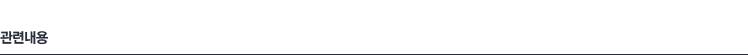|
||
|
에디터 : 박규동
|
2008년 8월 7일
채 마르지도 않은 옷을 주섬주섬 걸쳐 입고 모텔을 나섰다.
옷을 입고 물 호스로 샤워를 해도 한 시간도 못 되 말라 버리는 날씨가 아니더냐!
나흘째 날도 아침 6시에 모텔을 출발하였다.
남쪽에 있는 안면도 방향으로 길을 들어섰는데 길이 너무 한가로워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태안 해안의 찌꺼기 기름이 아직도 다 씻기지 않고 사람들 가슴에 남아 있는 걸까?
|
식당 앞 마당에 커다란 정자가 있어서 우리는 밥을 해 먹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
길가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은 자전거여행의 특권이다.
누추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은 세련됨이 따른다.
그것이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 먹는 자리라고 하여도 그 자리는 최고급 레스토랑이다. 셀프로 진행되는 모든 서비스도 기품이 넘친다. 어느 누가 이렇게 넓고 쾌적한 식당에서 당당하게 아내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인가!
길 가에서 어제 먹다 남은 빵을 먹었다. 집에서 만든 매실액 주스와 곁들여서.
아침 일곱 시 반, 77번 도로 한 모퉁이에서다.
|
길가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은 자전거여행의 특권이다. |
안면도 가는 길을 두고 왼쪽으로 돌아 서산간척지로 들어 섰다. 방조제 전체 길이가 20km가 넘는 것 같다.
서산B지구, 천수만간척 방조제 그리고 서산A지구 방조제를 건너면서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던 또 한 사람, 현대의 정주영 사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척지에는 벼가 힘차게 자라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서해안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게 있다. 해안선을 따라 간다고는 하지만 길은 늘 바다가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다.
서해안의 특성상 바다와 길을 가깝게 낼 수 없는 형편이란 걸 알게 된다. 그래서 바다와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방조제 길이다. 한편 바다이고 또 한편 육지이기도 했던 갯벌을 바다로부터 방조제를 쌓아 막아 버리고 온전한 육지를 만들어 놓은 게 간척지이다.
몇 년 간 바다 기운을 씻어 내고 농사를 짓던가 건물 터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국토가 되는 것이다.
서산A 방조제를 건너 오른쪽을 돌아서는 모퉁이에 학 무리가 목선을 타고 쉬는 풍경은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 주었다.
우리도 근처 솔밭에 들어가 메트리스 잠을 잤다. 한가롭게......
추억조차도 무게로 쌓여 짐이 되어버린 것인가? 이제 겨우 며칠인데......
홍성방조제를 건너면서 점심을 사 먹을 식당을 찾기로 하였으나 문을 연 식당을 찾을 수 없었다. 홍성방조제 남쪽 마을 어망동에서 식당을 찾았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이 길로 2km쯤 가면 가든이 있다고 하여 찾아갔으나 그 곳도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러나, 식당 앞 마당에 커다란 정자가 있어서 우리는 밥을 해 먹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점심을 해 먹고 나서 두어 시간을 더 쉬었다.
더위가 극심한 한낮에 갖는 낮잠은 정말 꿀맛이다. 체온도 식히고......
|
4년 전에도 자전거여행을 하면서 들렸던 가게다. |
대천 가까이에서 21번 국도를 탔다.
대천 시내로 들어간 게 저녁 5시 무렵이었으나 대지는 더위에 식지 않고 그대로였다.
시내 초입에 있는 가게에 들렸다. 4년 전에도 자전거여행을 하면서 들렸던 가게다. 주인 할머니는 그 때를 기억해 내지 못하였다.
아내에게 설레임을 하나 사 주고 나도 먹었다. 여행을 떠나고 나서 처음 먹는 얼음과자다. 시원한 물은 셀 수도 없이 마셨지만 얼음은 배탈을 일으킬까 봐서 그 간에는 자제해 왔던 음식이다. 맛 있었다.
바다가 원고지라면 석양과 자전거와 아내는 시어가 된 것일까?
살아서 움직이는 시.
|
대천항까지 와서 여객터미널 옆 정자에 텐트를 쳤다. |
대천항까지 와서 여객터미널 옆 정자에 텐트를 쳤다.
밥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장터에 가서 우럭 회를 한 접시 사 왔다. 햇볕에 달구어진 보도 블럭이 아직도 뜨겁다. 그 위에 메트리스를 깔고 저녁을 먹었다.
나흘 간 306km를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