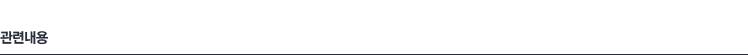|
||
|
에디터 : 박규동
|
2008년 8월 25일
서두르지 않고 차근 차근 진부령을 올랐다.
진부령은 꼭대기가 가까워 질 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약 20km짜리 고개이다. 지금은 미시령과 한계령이 생겨서 교통량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간선 구실을 톡톡이 하던 길이다. 아내는 각오를 다진다. 나도 속도를 늦추었다. 아내 트레일러의 짐 무게는 오르막에서 나를 겨우 추월할 수 있을 만큼 싣는다. 나머지 무게는 내가 다 감당한다. 오르막을 갈등없이 함께 오를 수 있는 비결이다.
굽이 굽이 돌아가는 진부령 길에도 여전히 칡넝쿨이 늘어져 있다. 그리고 꽃이 피었다. 그리고 칡꽃에서 향기가 났다. 이번 여행 내내, 전국 곳곳에서 칡꽃 향기을 맡을 수 있었다. 어디서 향을 풍기는지 조차 모를만큼 서민적이다. 꽃은 보이지 않고 향기만 맴돌 때도 있다.
이번 여행을 향기에 비긴다면 나는 칡꽃 향기 같은 여행이라고 말하고 싶다.
네 번을 쉬고 세 시간만에 진부령 꼭대기에 도달하였다.
아내가 뿌듯해 한다. 걱정 한 가지를 덜은 것이다.
진부령은 알프스 스키장이 있어서 겨울에는 자주 찾아 오던 산친구들에게는 정든 곳이다.
몇 년 전부터 알프스 스키장이 경영 부실로 폐장이 되었다. 미시령에 터널이 생기면서 속초로 가는 교통량의 99%를 빼앗기고, 한 철이긴 하여도 겨울에 찾아 오던 스키장 고객까지 잃어버린 것이다. 지금의 진부령 모습이다. 유령 마을처럼 빈집들이 보인다. 산 후배 진교식도 스키가 좋아서 진부령을 찾아 들었고 이곳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스키를 탔었다. 그러다가 급기야 주유소 문을 닫고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길이 돈이 되는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다행스러운 게 약하나마 뒷바람이 불었다.
백담사 입구 용대리까지 내리막을 즐겼다. 아내도 신바람이 나는 것 같았다.
점심은 만해기념관 옆에 있는 송어 횟집에서 먹었다. 방에 들어 가 다리를 쭉 펴고 회가 나올 때까지 쉬었다. 송어 1kg를 먹었다. 매운탕에 누룽지까지 알뜰하게 배를 채웠다. 아내가 제일 두려워 하던 진부령도 해치웠으니 이제부터는 태평이다.
|
송어회집의 송어들 |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속담처럼 말했던 오지의 대명사가 원통, 인제이다. 특히 그 지역으로 배치된 육군 졸병의 한이 서렸던 전설의 고장이다. 이제는 하루에도 수 천 대의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곳이 되었지만 말이다.
인제 휴게소에서 정자를 만나 낮잠을 잤다. 태평낮잠이다.
군축령 터널을 지난다. 터널에 대한 아내의 거부감도 많이 수그러들었다.
90년 대 초에 서울-속초-서울을 오가던 생각이 났다. 왕복2차선에 갓길도 없었던 길이었다. 고개도 많았고 거리도 더 멀었던 것 같다. 44번으로 도로 번호가 매겨지고 새로 공사를 하더니 지금은 고속도로처럼 평탄해졌다. 소양강을 끼고 굽이 굽이 돌아 가던 길이 교량으로 대신하면서 일자로 쭉쭉 뻗은 길이 되었다.
자전거를 배우고 나서 익숙해질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속초를 도전한다. 당일에 주파하는 것을 목표 삼아서이다. 이제 이 길은 자전거꾼들에게 도전해야할 하나의 목표가 돼있고 그걸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전설의 길이 된 것이다.
신남휴게소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신남을 지나 가니 고개를 맞았다. 바쁠 게 없어진 탓인지 자주 쉬었다. 어둑해질 무렵 가니고개를 넘었다. 내일이면 집에 가는 날이다.
어두워진 장남에서 민박을 찾아들었다. 여행의 마지막 밤이다.
|
50년 되었다는 민박집은 한옥이었다. |
지은지 50년이 되었다는 민박집은 한옥이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집 자랑을 하였다. 시할아버지가 625 때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 다시 지은 집이란다. 한옥이 제법이었다. ㅁ자 집인데 격을 갖추고 지은 집이었다. 남편이 교직생활을 하고 퇴직한 교사 집안이라고 했다. 남편의 형님, 누이, 동생 등 모두 아홉 명이 교사직을 했단다. 행랑 한 편에 그때 쓰던 풍금도 있었다.
선비의 내력을 읽을 수 있는 가풍이다.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이런 걸까?
이웃 서어나무새가 전화를 했다.
내일 자전거를 타고 마중을 오겠다는 전갈이다. 어디까지일지는 모르지만 44번 길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였다. 막내 아들 창민이도 마중을 오겠다고 한다.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인다.
이번 여행에 제일 기특한 것이 트레일러와 압력밥솥이다.
아마도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여행의 행복이 많이 경감 되었을 것이다.
밥을 지을 때마다 귀엽고 앙증맞은 압력솥에 나는 반했다. 불을 켜고 솥을 올리고 얼마 있으면 칙 칙 칙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정겹다. 느리던 박자가 빨라지면 지피던 불을 끈다. 솥의 압력이 풀릴 때를 기다리는 시간도 군침이 돌만큼 다감하다. 밥맛은 어떤가! 야영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분명 행복이다. 알미늄 등산냄비로는 어림도 없다.
칙 칙 칙....... 하루 중에서 제일 듣기에 좋은소리였다.
트레일러도 기가 막힌 선택이었다.
이번에 썼던 트레일러는 12년 전에 나와 창민이가 호주대륙을 횡단하면서 썼던 물건이다. 폭과 길이가 약 1m에 끌대가 1m 가량이다. 프래임은 강철로 만들어진 것인데 원래는 어린아이를 태우는 것이었다. 약간의 개조로 짐 싣기에 알맞은 짐끌이로 만든 것이다. 같은 게 두 개라 아내에게도 끌게 한 것이다. 처음에는 패니어를 달고 가겠다던 아내도 몇 번의 시운전을 하더니 트레일러를 선택하였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약 40kg을 아내는 20kg을 싣고 끌었다. 트레일러를 쓰면 좋은 것이 우선 짐을 갖고 가는데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부피와 무게를 최소한으로 갖고 가는 게 자전거여행의 원칙이다. 하지만 운반할 짐이 많은 경우에는 트레일러는 패니어나 다른 수단보다 낫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전거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게를 분산하기 때문이다. KOOL STOP 트레일러는 자전거와 연결하는 끌대의 조인트 부분이 로프로 돼 있어 방향성이 무척 자유롭다. 따라서 언덕을 오르거나 할 때에 일어나서 페달링하기가 쉽다.
당일 투어는 가볍게 배낭을 매고, 1~2박 야영 투어일 때는 BOB Yak 같은 외발 트레일러를 쓴다. 야영이 아니고 여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패니어도 좋다. 그리고, 1주일이 넘는 장정은 이번처럼 KOOL STOP 두 발 트레일러를 쓰는 게 나의 전술이다. "원 플러스 원"을 실어도 마음에 큰 부담이 없는 게 좋다. 그리고, 압력밥솥을 실을 수도 있잖은가! 노트북도 실을 수 있고!
내가 고안하고 아내가 박음질한 트레일러 깃발도 보기에 좋았다.
안뜰에 자전거와 깃발을 펄럭이는 트레일러 두 대를 나란히 세우고 마지막 밤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