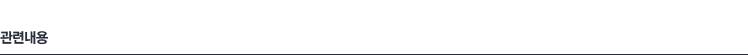|
||
|
에디터 : 박규동
|
2011년 07월 14일 木 맑음
46km 운행 야영지 44도38'32,98+110도35'01,87
10:45 - 섭씨34도. 13:20 - 섭씨39.5도.
 |
 |
|
|
사막은 바람의 바다이다.
때로는 소리없는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소리없이 귀에 들렸다. 삶과 죽음을 관통해 온 시간처럼 귀에 들렸다.
바람이 나에게 쪽지를 건넸다. "내가 빚진 술값 3만 원을 네가 대신 갚아다오! 나는 오늘도 술기운으로 바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라도 해야 바람이 분다면 그렇게 해야겠다. 오늘은 바람이 멈추었으니까.
바람, 그 속을 모르겠다. 도대체 그 깊은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다. 속이 찬 놈인지 뜨거운 놈인지? 초록인지 황사인지?
아! 바람아!
그 깊은 속에 나의 소리도 담아 가렴!
사잉샨드를 출발하여 오르공으로 갈 계획이다.
사잉샨드에서 몽골고비 남단 자밍우드까지는 약 250km, 하루에 30km씩 간다면 약 8일이 소요 된다. 가장 뜨거운 구간이기도 하다. 사잉샨드에서 남동쪽으로 첫 마을은 오르공이다. 약 50km.
일단 3일 분의 식량과 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침 9시에 문을 연다는 마켓에 갔으나 아직 문은 닫겨 있었다.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닛산 짚차를 타고온 30대 젊은이가 영어로 "뭘 도와드릴까요?"하며 다가온다. 물과 부식을 사야한다고 했더니 자기 차에 타라고 한다. 그를 따라 다른 마켓에 가서 물과 햄 등을 구해 왔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천사를 만났다.
 |
 |
|
자전거를 밀고 끌면서 턱을 넘어선다. |
하루를 쉰 덕에 발질이 가벼웠다.
우회전을 한 번 하고 철도건널목을 건넜다. 길 옆에 길이 있었다.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지만 오늘은 색다른 길이다. 완공되지 않은 포장도로가 또 나타난 것이다. 오늘은 벌써 천사가 두 번 나타난 셈이다. 나침반을 꺼내 견주어 보니 길은 남동쪽이었다. 그 길을 쫓아 가기로 했다.
차가 다니지 않았다. 길 중간 중간에 흙으로 장애물을 쌓아 놓았다. 완공이 되지도 않은 길에 큰 트럭이 다니면서 길을 망가트렸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막은 것이다.
길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 언덕을 끌거나 비켜 가더라도 이 길이 우리에게는 더 빠를 것같아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다.
길에서 가까운 게르를 만났다.
게르 옆에 물탱크를 싣고 있는 트럭이 관정을 통해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을 받고 있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이렇게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곳도 있는 것이다. 게르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니 중국노동자 2명이 게르 주인 식구들과 어울려 보드카를 마시고 있었다. 보드카를 내밀며 권주를 하는 중국인의 덩치가 웃통을 벗고 있어서 처음에는 얼른 내키지 않았지만 분위기 탓에 한잔을 받아 마셨다. 더운 날에 속이 뜨거워졌다.
도로공사판에 쓰일 물을 길어 가는 길이라 했다. 물을 길어 올리는 소형 모타 소리가 통통통 하는데 몽골인, 중국인, 한국인 세 나라 사람이 모였다고 서로 쳐다보며 웃었다. 주인 집 딸로 보이는 처녀도 있었다. 뚱뚱한 중국인 노동자의 눈빛이 익살스럽게 처녀의 엉덩이를 힐끗힐끗 노려본다.
사막에서도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었다. 외치고, 웃고, 울며 지나가는 여자의 엉덩이를 힐끗 처다보며 음심을 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다. 그런 눈빛도 아랑곳없이 처녀의 눈빛은 맑았다. 웃음이 맑고 착했다. 고단한 삶에서조차 티없이 누리는 행복한 표정..... 사막에서도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
 |
 |
|
|
 |
 |
오후 3시 반 경에 아내의 트레일러 바퀴가 펑크났다.
한창 뜨거운 낮이다. 이 타이어만 벌써 두 번째 펑크다. 타이어를 림에서 벗겨내고 속을 샅샅이 살폈다. 림 안쪽에 테이프를 덧대어 감았다. 타이어도 가시를 찾는답시고 손끝으로 일일이 더듬어 가며 찔린 곳을 찾아 보았다. 조립하여 트레일러에 장착하는 데까지 30분은 소요된 것 같다. 더워서 쥬스를 벌컥벌컥 마셨다.
지금까지 세 번의 펑크가 났었다. 여행의 거리와 도로의 환경으로 볼 때 이만 하면 좋은 편이다. 고마울 따름이다.
도로 덕에 50km나 왔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어 야영을 했다. 오늘처럼 바람이 없는 사막은 처음이다.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내가 술값을 몽땅 치루더라도 말이다.
 |
 |
 |
 |
 |
|
|
사막은 모든 게 담겨진 곳이다.
모든 낮과 밤이 담겨진다. 모든 바람이 담겨져 있다. 모든 구름의 그림자를 담아낸다. 지는 해와 뜨는 달을 담는다.
지는 해와 뜨는 달......
완벽한 밤이다.
인공조명이 전혀 없는 하늘이다. 별바다에 지구가 떠 있다. 지구에는 아내와 나, 둘만이 존재한다. 이런 날에는 나도 아내를 넘볼 수 밖에 없다.
밤이 찬란했다.
 |
2011년 07월 15일 金 맑음
32.5km 운행 야영지 44도26'06,13+110도51'51,45
 |
|
|
 |
|
|
길은 어렵지 않았다.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다. 그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반이나마 돼 있었던 포장도로는 언제부터인가 기층만 축조된 길로 변해 있었다. 도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따르면 우선 길이 놓일 자리를 잡아 터파기나 돋음을 하고 나서 도로의 버팀이 될 기초골재를 쌓는다. 그 기초골재가 기층을 이루어 길이 잡히면 기간에 따라 다시 다음 골재를 입혀가는 게 도로 만들기이다. 지금은 자갈로 이루어진 기층이 도로 형상을 하고 있다. 지름 3cm정도의 자갈이 노면에서 바글바글된다. 그래도 들판길의 빨래판보다는 낫다.
그 길 어느 모퉁이에서 우리는 또 다른 천사를 만났다.
오전이었다. 지나가던 트럭이 쉬고 있었고 그 트럭에 타고 있던 예쁜 아가씨가 양손에 양재기와 패트병을 들고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양재기에는 사탕과 과자가 담겨 있었고 패트병에는 알로에쥬스가 가득했다.
아내의 공용어가 아가씨를 웃게 한다. "자밍우드-베이징-한국!"하면서 아내는 깃발을 들어 보인다.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세운다. 엄지는 인류 최고의 찬사다.
"기사가 당신 남편이냐?"라고 아내가 묻는다.
아가씨는 용케도 알아 듣는다. "아니다. 나도 여행 중이다. 언제 한국에도 가고 싶다."
낮이 훨씬 겨워지며 볕이 뜨겁다.
익을 것 같다. 고비의 전형적인 날씨다.
13:05, 섭씨45도. 여행 중 기온을 관측한 이래 최고다. 짐승들도 드뭇해지고 먼 눈으로 보이던 게르도 보이지 않는다. 며칠 전부터 한낮에는 트럭도 다니지 않는다. 모두 더위 탓인 것 같다.
길 한가운데서 양산을 펴고 점심을 먹었다. 이럴 땐 왜 바람이 없는지 모르겠다. 술값이 다 떨어진 걸까?
더위에 지친 아내가 양산 아래서 트레일러에 기대어 눈을 붙인다.
 |
|
|
 |
|
|
 |
오늘은 바람이 없다.
그늘이 없고, 끝이 없다.
하도 더워서 도로 아래에 설치된 하수관에 들어가 잠시 낮잠을 잤다.
더위를 견뎌야 하는 게 사막여행이 아닌가!
자밍우드까지는 계속 이런 날씨가 예상된다.
약 150km가 남았다. 4~5일이 걸릴 거리이다. 우리가 준비한 식량과 물은 3일 분, 벌써 이틀이 지났다. 자밍우드까지는 델구르를 만날 수 없는 삭막한 길이다.
20~30km를 더 돌아 가더라도 에르덴에 들려서 식량과 물을 구입해야할 처지가 되었다. 에르덴으로 가기 위해서 남동쪽으로 진행하던 방향을 동쪽으로 틀었다.
공사 중인 도로에서 벗어나 동쪽으로 2km 가량 왔을 때에 뜻밖의 풍경을 보게 되었다. 10km 쯤 비스듬이 내려가는 계곡이 있었고 그 한 쪽에 마을이 나타난 것이다.
마을도 게르로 이뤄진 그런 동네가 아니었다. 유럽의 어느 시골을 보는 것 같았다. 초원과 양옥들로 이뤄진 마을에는 농사도 짓고 있었다. 양옥 옆에 게르가 보였다. 농부들이 밭에 물을 대고 있었다. 계곡의 낮은 부분에는 물이 고인 저수지가 있었고 말들이 물을 마시러 모여들었다. 목가적인 풍경에 조금 전까지 삭막했던 사막은 아스라하게 사라졌다. 이럴 수가?
 |
|
|
 |
 |
|
|
 |
|
|
 |
|
|
오아사스를 만난 것이다.
밭에서 일을 하던 30대의 농부에게 텐트를 쳐도 되는냐고 물었다. 이럴 땐 아내의 공용어가 소통을 훨씬 빠르게 한다. 게르 옆에 텐트를 지었다. 농부의 설명은 공용어로도 들을만 하였다.
"지하 40m에서 전기모타로 물을 끌어 올린다. 그 물을 커다란 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쇠파이프를 통하여 농경지에 공급한다."면서 물 펌프장을 보여주었다. 감자, 양파, 수박을 재배하고 있었다. 특히 몽골의 수박은 일품이라고 했다.
인간이 늑대에 대하여 늑대였다.
늑대가 인간에 대하여 늑대일 때보다 인간이 늑대에 대하여 늑대일 때가 더 부끄럽다. 특히 고비늑대에 대해서는 더욱 부끄럽다.
덫에 걸린 짐승 중에서 자신의 다리를 물어뜯고 탈출하는 짐승은 고비늑대 뿐이다. 그 위대한 고비늑대에 대하여 인간이 늑대보다 못한 짓을 했다니 너무 가슴 아프다. 미안하다!
 |
|
죽어서도 용맹을 잃지 않은 고비늑대 |
저녁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물탱크를 관리하는 40대 남자가 우리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따라 오라고 하였다. 궁금해서 따라갔더니 창고의 문을 열고 뭔가를 보여주었다. 오금이 밧줄에 단단하게 묶인 늑대였다.
나 흰늑대가 그토록 그리워 했던 바로 그 고비늑대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면서 저 높은 산에서 고비늑대를 잡았다고 나에게 자랑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전설의 고비늑대가 죽은 늑대로 흰늑대 앞에 있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고비늑대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전설처럼 황야에서 외롭게 죽어야 한다. 고비늑대는 그렇게 존엄을 지키며 죽어야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
인간의 치사함이 오늘처럼 부끄러운 날은 없을 것이다.
달이 떠 올랐다.
고비늑대의 달빛노래가 메아리 되어 들린다. 그렇게 울부짖었을 것이다.
 |
 |
 |
 |
여행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