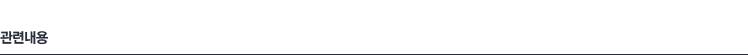|
||
|
에디터 : 설정환
|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전거 해외탐당 동아리인 '만리행'은 지난 2013년 12월 다섯명의 팀원들을 구성하여 인도 여행을 떠났다. 약 50여일 간 인도를 자전거로 여행하며, 그들이 겪었던 여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글 : 이초원 (한국외국어대학교 11학번)
어딘가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하다 못해 좋아하는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것이라도, 남이 어떻게 보든 개인의 입장에서 행복한 일이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자전거 여행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배를 움직이는데 흰천과 바람만 필요했다고 했 듯, 자전거 한대와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고, 일반 배낭여행이 줄 수 없는 영역의 경험을 준다는 점에서 엄청난 매력을 지닌 여행 방식이다.
그러한 점에서 '자전거 여행에 미친다는 것'은 비싼 학비에 치여 돈도 없고 사회가 정한 루트를 따르느라 숨 막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싶다.
우리 다섯 '설정환, 명동혁, 한동균, 이초원, 김보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전거 해외탐방 동아리 '만리행'의 동아리원으로서 이렇게 멋진 자전거 여행에 미쳐 인도로 떠난,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델리에 도착하던 날, 도심 속으로 진입하기도 전부터 나타난 많은 차들과 릭샤(3륜차), 오토바이들이 한데 뒤엉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도로 사황은 가히 경악스러울 정도였으며, 우리가 달려야 할 이 나라가 결코 녹록치 않은 곳임을 알려주었다.
더불어 여행 전부터 귀가 닳도록 그 심각성을 들어온 물갈이의 시작으로 새해가 밝아온 2014년, 우리 모두 평소 이하의 컨디션으로 스모그 뒤덮힌 복잡한 델리 도로를 전투적으로 달려야만 했다.
인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부터 녹록치 않은 환경을 선사해 주어 끝까지 강렬한 기억을 남긴, 센스쟁이 나라였다.
우리의 계획은 델리에서 뭄바이까지, 대략 1800km를 가로질러 가는 것으로 주로 이용한 도로는 NH8이다.
NH8은 인도의 수도인 델리와 재정적 수도인 뭄바이를 연결하는 메인 고속도로로서 인도의 핵심 물류 인프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과연 그 명성대로 초반 델리에서 빠져나가는 곳은 왕복 8차선이라는, 인도에서 보기 어려운 큰 규모를 보여주었고, 끝까지 정갈한 도로면과 좁은 간격으로 위치한 호텔과 음식점들은 이 도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런 도로의 끄트머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객기'일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해 보였지만, 달리는 중간 중간 저 멀리서 지역 주민들이 기어이 우리를 따라 브레이크 제대로 먹힐까 염려스러운 낡은 자전거거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24단의 기어와 완벽한 브레이크, 헬멧까지 갖춰 쓴 우리는 가히 완전무장을 하고 달리는 느낌이었다.
인도에서의 주행은 정말 기분 좋게 색달랐다. 한국에서 자전거는 자동차 운전자에게서 한소리 듣고 보행자에게선 두소리 듣는 애물단지와 같은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인도에선 자전거 자체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데다 질서라곤 찾아볼 수 없는 교통상황이 운전자들에게 인내심을 길러준 탓인지, 자전거의 존재자체가 크게 문제 되진 않는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나라를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우리가 도로 끝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면 덤프트럭들이 클락션을 크게 '빵' 쳐서 손을 내밀어 인사를 해준다거나, 오토바이들이 우리와 속도를 맞춰 달리며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등의 기대 이상의 호의를 베풀었다.
자전거 여행을 통해 중간 중간 사람들과 많이 접촉할 수는 있지만 달리면서까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나라는 몇이나 될까. 삭막한 도로의 주행마저 즐겁게 만들어준 인도인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페달질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힘을 주었다.
NH8과 같은 메인 루트 뿐 아니라, 우린 작은 고속도로와 비포장 도로 등의 시골길, 산길로 빠져 달리기도 했다. 확실히 NH8보다는 속도도 나지 않았고 자전거가 쉽게 상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 상태가 좋지도 않다는 점에서 고생스러운 길이었다.
인도의 인프라가 많이 약하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신흥국가라는 타이틀을 두고 볼 땐 매우 초라한 정도였다.
도로의 취약성을 가장 심하게 느낄 때는 뭐니뭐니해도 야간 주행 때였다. 예정된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야간주행을 감행해야 하는 때면, 가로등 하나 없고 주변에 마을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밤거리를 전조등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그야말로 심장이 매우 쫄깃해지는 목숨을 건 주행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시골길의 매력은 남달랐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덤프트럭을 조심해가며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NH8과 달리, 차 한대 제대로 보기 어려운 시골길은 차 대신 귀여운 소들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한결 평화로운 상태였다.
더군다나 길 너머로 보이는 노란색 겨자꽃밭과 웅장한 느낌마저 주는 황무지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에 취해 달리게 만들어 깔끔한 고속도로와는 또 다른 행복을 선사했다.
결국 주행하기 편하게 포장되어 있는 NH8이든, 울퉁불퉁한 시골길이든, 인도는 정말 독특한 매력을 자전거 여행자에게 선사해주었고, 둘을 모두 느껴볼 수 있는 주행을 한다면 지루할 틈 없는 완벽한 자전거 여행이라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뭄바이로 내려가는 내내, 아침 주행을 할 때면 8시 즈음에 떠오르던 태양이 점점 7시 30분이 채 되기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델리의 겨울에 벌벌 떨며 이것저것 껴입고 달리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길가에 드리워진 야자수를 따라 'malihang team sarak'라는 문구가 적힌 주행복만 입고 달려도 무방할 정도로 따뜻한 날씨를 맞이하였다.
18번의 주행 끝에 내려온 1800km의 변화는 실로 분명했고, 그것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는 점에서 보통 사람들에 비해 2~3배로 와 닿을 수 있었다.
그때 우리는 느꼈다. 54일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고, 1800k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더불어 이렇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달려온 거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나라가 우리가 선택한 이 아름다운 인도라는 것에 다들 더욱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평생 앞만 바라보고 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나의 또 다른 한계를 체험할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미친 듯이 몰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전거 여행은 기대 이상의 감동을 준다.
하지만, 이 또한 그 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멋진 배경인 국가, 관심을 주는 사람들, 힘을 나누는 팀원이 없다면 충분히 아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도 자전거 여행은 기대를 200% 만족시킨 최고의 여행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몇년이 지난 후, 이때의 향수에 새로운 곳으로 자전거 여행을 떠나고 싶다 느낄 때, 또다시 짚게 되는 인도를 보면서 우리 모두를 미소가 지어질 것 같다.
 |
|
|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전거 해외탐방 동아리 '만리행', 지난 겨울 떠난 인도 이야기를 들어보자. | |
글 : 이초원 (한국외국어대학교 11학번)
어딘가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하다 못해 좋아하는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것이라도, 남이 어떻게 보든 개인의 입장에서 행복한 일이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자전거 여행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배를 움직이는데 흰천과 바람만 필요했다고 했 듯, 자전거 한대와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고, 일반 배낭여행이 줄 수 없는 영역의 경험을 준다는 점에서 엄청난 매력을 지닌 여행 방식이다.
그러한 점에서 '자전거 여행에 미친다는 것'은 비싼 학비에 치여 돈도 없고 사회가 정한 루트를 따르느라 숨 막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싶다.
우리 다섯 '설정환, 명동혁, 한동균, 이초원, 김보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전거 해외탐방 동아리 '만리행'의 동아리원으로서 이렇게 멋진 자전거 여행에 미쳐 인도로 떠난,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
델리에 도착하던 날, 도심 속으로 진입하기도 전부터 나타난 많은 차들과 릭샤(3륜차), 오토바이들이 한데 뒤엉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도로 사황은 가히 경악스러울 정도였으며, 우리가 달려야 할 이 나라가 결코 녹록치 않은 곳임을 알려주었다.
더불어 여행 전부터 귀가 닳도록 그 심각성을 들어온 물갈이의 시작으로 새해가 밝아온 2014년, 우리 모두 평소 이하의 컨디션으로 스모그 뒤덮힌 복잡한 델리 도로를 전투적으로 달려야만 했다.
인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부터 녹록치 않은 환경을 선사해 주어 끝까지 강렬한 기억을 남긴, 센스쟁이 나라였다.
 |
|
|
인도의 표지판 | |
 |
 |
|
|
펑크를 떼우는 동혁 | |
우리의 계획은 델리에서 뭄바이까지, 대략 1800km를 가로질러 가는 것으로 주로 이용한 도로는 NH8이다.
NH8은 인도의 수도인 델리와 재정적 수도인 뭄바이를 연결하는 메인 고속도로로서 인도의 핵심 물류 인프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과연 그 명성대로 초반 델리에서 빠져나가는 곳은 왕복 8차선이라는, 인도에서 보기 어려운 큰 규모를 보여주었고, 끝까지 정갈한 도로면과 좁은 간격으로 위치한 호텔과 음식점들은 이 도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런 도로의 끄트머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객기'일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해 보였지만, 달리는 중간 중간 저 멀리서 지역 주민들이 기어이 우리를 따라 브레이크 제대로 먹힐까 염려스러운 낡은 자전거거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24단의 기어와 완벽한 브레이크, 헬멧까지 갖춰 쓴 우리는 가히 완전무장을 하고 달리는 느낌이었다.
 |
 |
 |
|
|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소녀 | |
인도에서의 주행은 정말 기분 좋게 색달랐다. 한국에서 자전거는 자동차 운전자에게서 한소리 듣고 보행자에게선 두소리 듣는 애물단지와 같은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인도에선 자전거 자체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데다 질서라곤 찾아볼 수 없는 교통상황이 운전자들에게 인내심을 길러준 탓인지, 자전거의 존재자체가 크게 문제 되진 않는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나라를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우리가 도로 끝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면 덤프트럭들이 클락션을 크게 '빵' 쳐서 손을 내밀어 인사를 해준다거나, 오토바이들이 우리와 속도를 맞춰 달리며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등의 기대 이상의 호의를 베풀었다.
자전거 여행을 통해 중간 중간 사람들과 많이 접촉할 수는 있지만 달리면서까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나라는 몇이나 될까. 삭막한 도로의 주행마저 즐겁게 만들어준 인도인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페달질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힘을 주었다.
NH8과 같은 메인 루트 뿐 아니라, 우린 작은 고속도로와 비포장 도로 등의 시골길, 산길로 빠져 달리기도 했다. 확실히 NH8보다는 속도도 나지 않았고 자전거가 쉽게 상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 상태가 좋지도 않다는 점에서 고생스러운 길이었다.
인도의 인프라가 많이 약하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신흥국가라는 타이틀을 두고 볼 땐 매우 초라한 정도였다.
도로의 취약성을 가장 심하게 느낄 때는 뭐니뭐니해도 야간 주행 때였다. 예정된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야간주행을 감행해야 하는 때면, 가로등 하나 없고 주변에 마을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밤거리를 전조등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그야말로 심장이 매우 쫄깃해지는 목숨을 건 주행을 해야 했다.
 |
|
|
개들의 천국 인도 | |
 |
|
|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와 개, 그리고 쓰레기 | |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시골길의 매력은 남달랐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덤프트럭을 조심해가며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NH8과 달리, 차 한대 제대로 보기 어려운 시골길은 차 대신 귀여운 소들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한결 평화로운 상태였다.
더군다나 길 너머로 보이는 노란색 겨자꽃밭과 웅장한 느낌마저 주는 황무지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에 취해 달리게 만들어 깔끔한 고속도로와는 또 다른 행복을 선사했다.
결국 주행하기 편하게 포장되어 있는 NH8이든, 울퉁불퉁한 시골길이든, 인도는 정말 독특한 매력을 자전거 여행자에게 선사해주었고, 둘을 모두 느껴볼 수 있는 주행을 한다면 지루할 틈 없는 완벽한 자전거 여행이라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
|
뭄바이 얼마나 남았니? | |
 |
 |
|
|
수박의 맛 | |
 |
|
|
함삐에서 단체사진 | |
뭄바이로 내려가는 내내, 아침 주행을 할 때면 8시 즈음에 떠오르던 태양이 점점 7시 30분이 채 되기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델리의 겨울에 벌벌 떨며 이것저것 껴입고 달리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길가에 드리워진 야자수를 따라 'malihang team sarak'라는 문구가 적힌 주행복만 입고 달려도 무방할 정도로 따뜻한 날씨를 맞이하였다.
18번의 주행 끝에 내려온 1800km의 변화는 실로 분명했고, 그것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는 점에서 보통 사람들에 비해 2~3배로 와 닿을 수 있었다.
그때 우리는 느꼈다. 54일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고, 1800k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더불어 이렇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달려온 거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나라가 우리가 선택한 이 아름다운 인도라는 것에 다들 더욱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
 |
 |
 |
|
|
함삐에서의 추억 | |
 |
 |
|
|
비둘기와 암베르성 | |
평생 앞만 바라보고 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나의 또 다른 한계를 체험할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미친 듯이 몰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전거 여행은 기대 이상의 감동을 준다.
하지만, 이 또한 그 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멋진 배경인 국가, 관심을 주는 사람들, 힘을 나누는 팀원이 없다면 충분히 아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도 자전거 여행은 기대를 200% 만족시킨 최고의 여행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몇년이 지난 후, 이때의 향수에 새로운 곳으로 자전거 여행을 떠나고 싶다 느낄 때, 또다시 짚게 되는 인도를 보면서 우리 모두를 미소가 지어질 것 같다.